‘한국이 말한다’를 시작할 때

* 2017년부터 해마다 열리는 ‘독일이 말한다’에서, 생각이 크게 다른 두 사람이 짝을 이뤄 대화를 하고 있다. <디 차이트> 온라인
소셜미디어를 넘겨보다 몇번 불편하면 ‘친구 끊기’를 해버린다. 다만 전부 정리하지는 않았는데, 끼리끼리 뭉쳐 있다 ‘확증편향’에 빠지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하지만 지난 대선 시기, 모든 면에서 내 생각과 반대인 정치적 주장들을 참아내기 힘들었다. 그와 나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이걸 공동체라 할 수 있나, 이런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됐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세계가 맞닥뜨린 고민이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디 차이트>는 양극단으로만 향하는 원심력을 줄이고, 서로에 대한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나 고민했다. 기자들이 아이디어를 냈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굴 보고 만나는 마당을 만들어보자고 했다. 정치적 적대감, 이주민이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 같은 걸 꺼내놓고 이야기해보자고 했다. 이렇게 해서 2017년 ‘독일이 말한다’(Deutschland Spricht)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디지털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여자를 모집했다. 응모한 사람에게 7가지 질문에 ‘네’ ‘아니요’로 대답하도록 했다. “독일은 국경을 좀 더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같은 간단한 질문들이었다. 답변을 분류해 생각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사람끼리 짝짓고, 사는 지역도 고려해 대화 상대로 배정했다. 그해 6월18일 독일 전역에서 1만2천여명이 일대일 또는 소그룹으로 만나 2시간 남짓 관심 있는 주제를 놓고 대화했다. 이듬해인 2018년에는 <디 차이트> 외에도 11개 독일 언론사가 공동주관해 두 번째 대회가 열렸다. 참가한 사람은 2만8천여명으로 늘었다.
반응은 고무적이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스크림 카페에서 두 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처음 추측과는 달리 많은 지점에서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디 차이트> 편집장 바스티안 베르브너에게 보내왔다. 평소 색안경을 끼고 봤던 이가 그저 평범한 이웃이란 걸 깨달았을 때의 느낌도 메일에 담았다. “페기다(반이슬람 정치조직) 괴물이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을 상상했죠. 대신 그 자리에는 마음씨 좋고 따뜻하며 똑똑하면서도 유머러스한 여성이 자전거를 끌고 언덕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관점으로 세계를 보고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이 말한다’는 계속 열려 지난해까지 연인원 11만5천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참가자 2만4천여명 중 절반 이상이 “상대방의 말이 한두가지는 설득력 있었다”고 답했고, 4천여명은 “1~2개 문항에서 처음 체크한 답과 달리 생각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처음 두 해의 결과를 분석한 독일 본대학의 행동경제학자 아르민 팔크는 “정치적으로 입장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단 두 시간만 대화해도 편견이 흔들리고 극단적인 생각이 누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에 대해 갖고 있던 ‘무능하고, 사악하고, 무식하다’는 생각도 줄어드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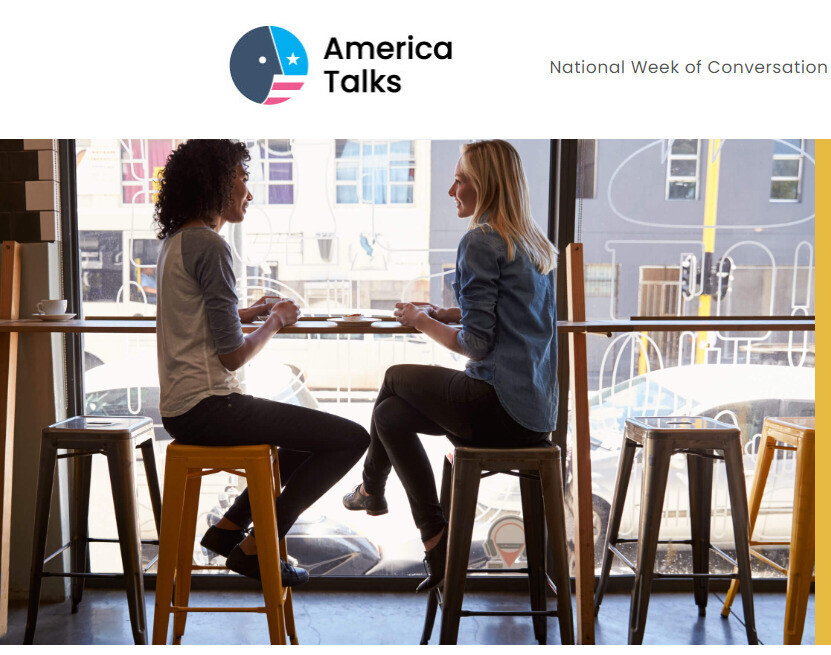
독일의 성과가 디딤돌이 돼, 이 프로젝트는 2019년 ‘내 나라가 말한다’(My Country Talks)로 확대돼,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유럽이 말한다’ 행사가 열리게 됐다. 이해에 유럽연합 회원국을 포함해 모두 33개국에서 1만6천여명이, 2020년에는 2만여명이 참여했다. 이 점을 평가해 행사를 주관한 언론사 관계자들이 유럽 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를 기리는 상을 받기도 했다.
대서양을 건너 지난해 열린 ‘미국이 말한다’에는 6천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고, 올 4월에도 100여개 주제를 놓고 두 번째 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경청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대화의 원칙을 함께 읽고, 가벼운 대화에서 출발해 토론에 들어갔다. 이 대화의 플랫폼은 내년에는 ‘세계가 말한다’(The World Talks)로 개편돼 국가, 도시, 동네, 대학 등 다층적인 대화를 엮어내는 마당이 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라고 했다. 남북 분단에 이어 공동체의 분단으로 이어질 생각의 분열을 언제까지 디지털 탓, 언론 탓, 정치 탓만 하고 있을 수 없다. 뭐라도 하려는 이들이 세계 곳곳에서 대면 토론을 조직하고 있다. 스마트폰에 파묻은 얼굴을 들고, 댓글 달던 손을 멈추고 서로 마주 앉는 일이다. 생각보다 많은 서로의 공유 지점을 찾아가는 대화다. 이제 ‘한국이 말한다’를 시작할 때다.
이봉현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시사,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 기로에 선 아시아 (0) | 2022.05.24 |
|---|---|
| 미국에 백지수표는 주지 마라 (0) | 2022.05.20 |
| 국민건강 수호 코로나전쟁 방역 총사령관 국민영웅 정은경, 무궁화훈장으로 예우하라 (0) | 2022.05.19 |
| 보수정권서 여야 함께 기린 5·18 정신, 다신 폄훼 없어야 (0) | 2022.05.19 |
| 일본이 한국 대통령을 응원할 때 벌어지는 일 (0) | 2022.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