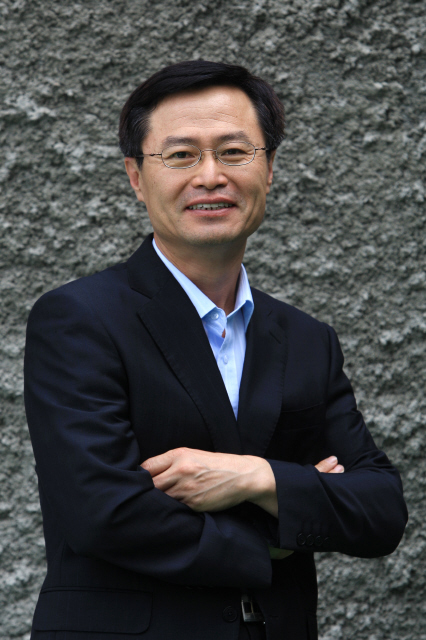|
|
|
정작 미국은 시장만능의 덫에 갇혀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빈곤대국으로 굴러가고 있다
흑백 간에 화장실은 물론 수도꼭지를 따로 쓸 만큼 인종차별이 심했던 1960년대 미국 남부 미시시피.
낮은 시급을 받고 일하는 흑인 가정부들은 말대꾸조차 허락되지 않는다.영화 <헬프>(가정부)는 흑인 가정부들이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끄집어내는 과정을 그렸다. 그리 새롭지 않은 소재지만 미국에서 꽤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영화를 보면 자연스레 지금의 미국이 그려진다. 흑인 가정부가 유색인종과 백인까지 뒤섞인 온갖 직종과 연령대의 월가 시위대로 불어난 점이 다를 뿐이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덫에 걸렸다” “평생 일해왔는데 10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영화 속의 대사는 조금도 낯설지 않다. 폭력과 차별은 없어졌지만,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신분은 고착화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평균소득은 상승했지만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의 중앙치는 실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의 출현으로 소득의 평균치는 올라갔지만, 중앙치 부근 중류층의 개인 소득은 변하지 않거나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풍요의 상징이었던 중류층은 저소득층에 흡수되고 있다.
최근 미국 인구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빈곤층 비율은 16%로, 무려 5000만명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에 속했다. 세대 간에도 격차가 벌어져 65살 이상 가장이 있는 가구의 자산이 35살 미만 젊은 가장이 끌고 있는 가구의 자산보다 47배나 많았다.
소득 격차와 함께 아메리칸드림도 사라졌다. 빈곤가정에서 자란 대부분의 사람은 역시 같은 생애와 운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요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도 살림살이가 빠듯해지자 닭을 기르는 집이 늘어 병아리 부화 회사가 성업중이라고 한다. 청산 직전의 주정부는 교사들을 대량 해고해 학년이 다른 학생들이 합반 수업을 하는가 하면, 넘쳐나는 노숙인들에게 편도 항공권을 주며 다른 주로 내쫓고 있다.
노력하면 잘살 수 있다는 이념과 암울한 현실 사이의 괴리로 미국 사회의 일체성은 무너졌다. 정부도 손을 쓸 힘이 거의 없다. 그런데도 월가 시위가 폭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까닭은 자유경쟁과 소유-개인주의라는 미국식 합리주의가 체화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인 다수는 여전히 부는 개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으며 가난은 자기 책임이라는 시장원리의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미국은 문화적 배경도 다르고 출신 계급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든 나라여서 통합을 위해서는 보편적인 이념이 요구된다. 미국인들은 문화적 특수성을 배제한 시장 메커니즘이야말로 어디서든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원리라고 믿었다. 하지만 시장만능주의는 투명성과 효율을 높이는 데 일부 기여하지만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사회적 유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시장 메커니즘이나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장치의 모양새는 민주적일지언정 정보를 더 가진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결코 평등하지 않다. 결국 소수의 득을 보는 세력이 있으므로 자유경쟁의 신화가 확산된 것이고, 그 귀결은 승자독식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부호가 1인승 버스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 출근하거나 헬리콥터를 타고 출근해도 미국에선 누구도 시비 걸지 않는다.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은 지나치다고 여기며 그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
세계는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로 인해 이미 값비싼 청구서를 받았다.
정작 미국은 시장만능주의의 덫에 갇혀 스스로 관성을 제어하지 못하고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빈곤대국으로 굴러가고 있다.
빛바랜 미국의 신화를 좇느라 난리법석을 떠는 건 더욱 미련하다.
[ 정영무, 한겨레 논설위원, young@hani.co.kr ]
| ||||||||||
'(한미 FTA)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미FTA 발효 이후에도 토지공개념을 꿈꾸나? (0) | 2011.11.23 |
|---|---|
| "멕시코가 굶고 있다" 북미 FTA 18년의 참상 (0) | 2011.11.23 |
| FTA 날치기 한나라당,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0) | 2011.11.23 |
| 2011년 11월 22일, 제2의 국치일입니다 (0) | 2011.11.23 |
| 쇠고기 광우병 검역조차...한미FTA의 '무서운 진실' (0) | 2011.11.22 |